유준 선생의 <묵의사유>전에 전시된 작품들이 다 좋습니다. 그걸 대전제로 하고라도 "너는 어떤 그림이 가장 인상적이냐"고 묻는다면 저는 <깨어나라(2023)>를 들고 싶습니다.
나름 이유를 든다면 수묵담채의 특장이 최고조로 발휘된 작품인 것 같고, 또 많은 생각을 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전시회에 갈 때마다 화폭을 한참씩 바라보곤 했는데, 돌아온 후에도 이 그림이 자꾸 생각납니다.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사유를 심하게 자극하는 작품인 것이지요. (묵의 '사유'가 맞습니다.^^)

용과 미륵보살을 함께 그린 작품은 드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저는 처음입니다. 게다가 제목이 <깨어나라>라고 하니, '으잉? 뜬금없는 걸?'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어에서 '용'은 한자어이고 그 고유어가 '미르'라는 데에 생각이 미쳤습니다. 그 순간 전율이 확 오더군요. 미륵과 미르...
대승불교에서 미륵불은 미래불이라고 합니다. 과거불인 연등불, 현재불인 석가모니와 함께 영겁의 과거에서 무한한 미래까지 불변으로 존속하는 진리를 깨달은 존재들이지요.

석가모니의 예언에 따르면 미륵보살은 인간계에서 설법하다가 4천세(사람 나이로는 56억7천만년)가 되면 용화수 밑에서 성불하고, 그때 미륵불이 될 것이라고 했더군요.
중국과 한국에서는 미륵보살이 세상을 구원한다는 혁명 사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난세에는 미륵보살에게 구원을 기원하는 미륵신앙이 민중들 사이에 널리 유포되곤 했지요.
한국의 미륵신앙은 삼국시대부터 편만했던 것 같습니다. 6세기에 이르면 미륵에 대한 설화가 많아지기 때문이죠. 백제의 무왕, 신라의 진지왕과 선덕여왕 등이 미륵 설화에 등장하는 걸 보면, 일반 민중에서 왕실에 이르기까지 미륵신앙을 널리 받아들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 2층의 미륵보살 전시실에는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유준 작가가 형상화한 것이 바로 이 조각이죠. 미륵보살이 깊은 생각에 잠겨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유준 작가는 이 그림에 <깨어나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미륵보살을 56억년이라는 먼 미래에 올 구원자로만 본 것이 아니라, 깊은 생각에 잠긴 한국인들에 비유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반가사유'란 '반쯤 잠들어서 생각만 하고 있다'는 뜻이죠.
물론 생각은 중요합니다. 미국에는 "누가 내 빵에 버터를 발라주는지 모른다"는 표현이 있고, 한국에는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먹어 봐야 아느냐"는 힐난이 있습니다. 오죽하면 함석헌 선생께서 "생각하는 백성이라야 산다(1958)"는 글을 쓰셨겠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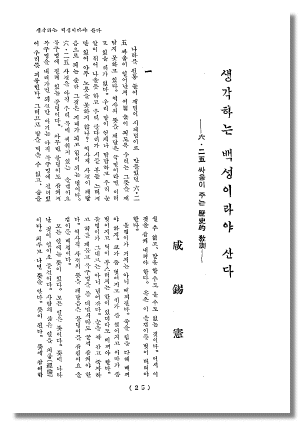
역사적으로 사회는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 그리고 그 중간에 생각하는 계급이 있습니다. 흔히 지식인이라고 하죠. 이 생각 계급이 지배 계급에 빌붙으면 민중이 수탈당하고 속절없이 죽어나가는 거죠. 그래서 미륵이나 예수 같은 구원자를 기다리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백성이 주인이라는 민주 사회입니다. 그런데도 대한민국에서는 법조인과 교수, 언론인과 종교인 등의 생각 계급이 대부분 기득권에 빌붙어 있습니다. 곡학아세의 전형이죠.

그래서 이제 백성이 직접 생각하고 직접 행동해야 합니다. 반쯤 잠들어 생각만 하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노무현 선생이 강조한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이 바로 그 말일 겁니다.
유준 선생이 이 그림에 <깨어나라>는 제목을 준 것도 그런 배경이 아닌가, 짐작합니다. 깨어서 일하면 미래의 미륵을 기다리지 않아도 되고, 자신이 미르가 되어 승천할 수 있으니까요.

<깨어나라>의 미르는 푸른 용입니다. 그림 상단에는 태극기가 있는데, 사괘는 검은색, 태극의 상단은 붉은 색으로 제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태극의 하단이 검습니다. 푸른 용은 이 검은 색을 대체하기 위해 승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민국을 제대로 완성하려는 것이지요.

생각하는 미륵과 승천하는 미르... 제가 너무 나간 것이나 아닐까, 하는 우려도 없지는 않습니다만, 이것이 유준 선생의 <깨어나라(2023)>가 제게 준 이해입니다. (jc, 2024/1/17)
'essays'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묵의2024사유] 6. 멍냥과 수묵담채 (0) | 2024.01.26 |
|---|---|
| [묵의사유2024] 5. 흐르는 강물처럼 (0) | 2024.01.22 |
| [묵의사유2024] 3. 개보다 고양이 (1) | 2024.01.13 |
| [묵의사유2024] 2. 여전히 혼자 (1) | 2024.01.13 |
| [묵의사유2024] 1. 어쩌다 혜화동 (1) | 2024.01.13 |



